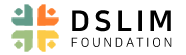과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이든지 항상 옳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그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를 가늠하게 해 주는 지혜의 구절이 있어 함께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금강경에 대한 다섯 주석서인 오가해에서 나오는 경구입니다. 본디 첫 행만으로 전개되지만 그 뜻을 새기기 위해서 네 단계로 돌리는 풀이도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