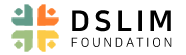똥을 먹고 밥을 싼다
정재현 교수
[변과 밥은 한통속이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하고 또한 잘 먹었으면 잘 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바랄까요? 이 세 가지는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잠시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이 똘똘 뭉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먹고 싸는 일은 떼어놓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이가 불편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밥 먹고 똥 싸는 일은 ‘한통속’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밥과 똥이 과연 ‘한통속’에서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사실 밥이 들어가는 구멍과 똥이 나오는 구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만큼 열려 있고 그 자체로는 비어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열려 있고 비어있기까지 한 밥줄과 똥줄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밥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고 소장과 대장의 각종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으로 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밥이고 어디서부터 똥인가?’ 이렇게 물으니 밥과 똥의 경계가 생각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밥과 똥을 확실하게 갈라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만도 않고 대책 없이 추하지만도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기존 관념에서 그렇게 멀리 떼어놓을수록 좋은 것으로 잘못 여겨졌던 밥과 똥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도 불확실하지만 이동 방향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이 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똥이 밥으로 옮겨가는 방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똥이 어떻게 밥이 된다는 걸까요.
[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싼 똥은 재래식이던 수세식이던 모양만 달리 할 뿐 결국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재래식은 좀 더 직접적으로 땅으로 스며들고 때로 밭에 거름으로 사용되니 이건 눈으로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밭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는 우리의 똥이 스며들어 형성된 자양분을 섭취한, 즉 모양과 냄새를 달리한 또 다른 똥입니다. 그러한 풀을 뜯어 먹은 초식동물을 고기로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육식동물이라 해도 이런 먹이사슬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혹 수세식은 다르다고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조를 거쳐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 거대한 흐름을 따라 강으로 바다로 그리고 다시 하늘로, 그리고 또 다시 땅으로, 그리고 동식물의 입을 거쳐 결국 사람의 입으로 밥이 되어 돌아옵니다. 먹고 싼 똥이 그렇게 밥이 되어 우리 입에 들어오니 사실 우리는 똥을 먹고 밥을 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대한 순환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서 에제키엘의 이야기도 이 대목에서 새길 만합니다.
“보리과자를 굽듯이 빵을 굽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분으로 불을 피우고 거기에다 구워먹어라. …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 쇠똥을 피워 빵을 구워라.”
<구약성서>, 에제키엘 4:12, 15
이쯤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울 수도 있다는 말이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저 똥을 더럽다고만 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가요? 그동안 무엇을 놓쳤던가요? 굳이 읊조리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더합니다. 우리는 똥을 쌀 때 한통속에 있는 모든 똥을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느낌으로 일을 치른다고 해도 똥인지 밥인지 경계 불분명한 부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몸 안에 똥을 담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부처에 대해 묻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스승 운문선사의 대답은 정곡을 찌릅니다. 무문 혜개의 <무문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전해 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운문 선사가 대답합니다. “마른 똥 막대기다” 무문 혜개, <무문관>
부처를 ‘똥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위의 밥과 똥 이야기를 이어본다면, 운문선사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밥과 똥이 서로 오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인즉, 깨끗하고 고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밥과 똥의 경계를 가르기도 쉽지 않고 쌍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니 우리가 고결하고 대단하다는 착각만 멈추더라도 우리 삶이 한결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