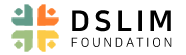괜찮아!
정재현 교수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세 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 왜 그래 /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 문득 말해봤다 /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 괜찮아 /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 괜찮아
왜 그래, 가 아니라 / 괜찮아 / 이제 괜찮아.
한강,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왜 그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물음이 이유를 묻는 것이지만 “왜 그래?”라고 묻는 것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대체로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물음이라기보다는 불만이고 시비입니다. 때로 신경질적인 억양으로, 물론 때로는 아주 설득적인 억양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말은 물음이라기보다도 더 깊은 뿌리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입니다.
생후 두 달된 아기가 까닭 없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겪었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익숙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라는 엄마의 판단도 있거니와 참으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계속 울고 있다네요. 울음의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울음을 아기만 울까요? 우리도 그런 울음을 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울고 있습니다. 이유를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때로 울고 있기도 하고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뿐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엄마가 보기에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니 달리 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아기에게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를 뿐이겠지요. 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울 때, 아니 우리가 울고 싶을 때 그 이유를 깔끔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울어도 좋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 받은 이후 울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더 슬픈 일입니다. 울음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울음을 잃어버린 것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픈데다가 “왜 그래?”라고 묻는다면 이건 상처에다가 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을 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답도 없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쳐 말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사실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고쳐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건 문득 고치는 것입니다. ‘가르침 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그래?”라는 물음을 무수히 물어오는 과정에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앎을 늘여서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켜가 쌓이면서 문득 튀어 오른 깨달음입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삶이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앎은 이유를 더 캐물으려 하지만 삶은 이유를 몰라도 모른 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요. 그래서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넘어갑니다. 문득 슬며시 넘어갑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갑니다.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삶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울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만은 아닙니다. 엄마의 울음이 아기를 더욱 크고 길게 울도록 만들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엄마가 울음을 멈추니 아기도 울음을 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내 울음을 울지만 내 울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내 안에서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다독였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흐느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괜찮아”야말로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해주는 지혜인 듯합니다.
그러나 “괜찮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값싼 방임은 아닙니다. 무수한 시행착오의 “왜 그래?”라는 시비의 씨름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왜 그래?”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그저 바로 “괜찮아”로 도망간다면 사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왜 그래?”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에서 “괜찮아”라는 말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내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구 내뱉은 “괜찮아”는 기만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괜찮아”가 자기기만이 되지 않으려면 “왜 그래?”의 씨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득!